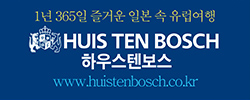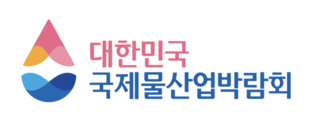- 원앙, 물닭, 청둥오리, 민물가마우지, 갈매기 등 한 눈에
- 3월이면 겨울 철새 대부분 떠나
- ‘사랑의 새’ 원앙 200마리 둥지…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 ▲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된 원앙은 전 세계적으로 2만여 마리가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위기 관심대상(LC)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 수는 2000여 마리로 추정되고 그 중 일부는 텃새가 되어서 우리나라 하천, 호수, 계곡 등에 서식하고 있다. |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를 하루 앞두고 겨울의 끝자락을 보이고 있다.
유난히 따듯한 지난 겨우내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동료들과 월동한 겨울철새들도 서서히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먼 길을 떠나려면 충분히 영양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이활동에 분주하다.
 |
| ▲ 연신 물속을 오가며 먹이활동에 여념이 없는 오리들 |
서울시 지정 1호 철새보호구역인 중랑천철새보호구역은 청계천 하류인 청계천종합종말처리장 앞과 중랑천 합수 부분부터 한강에 이르는 Y자 모양의 두물머리 약 3.3㎞ 구간의 59만1000㎡이다.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면서 강폭이 넓어지고 수량이 풍부하며 비교적 맑은 3급수로 사람의 접근도 어려워 특히 겨울철이면 많은 새들이 깃드는 도심 속 철새도래지이다.
 |
▲ 중랑천철새보호구역은 청계천 하류인 청계천종합종말처리장 앞과 중랑천 합수 부분부터 한강에 이르는 Y자 모양의 두물머리 약 3.3㎞ 구간의 59만1000㎡이다. |
원래 중랑천은 1980년대 말까지 서울의 대표적 오염지대로 생활하수에 분뇨까지 뒤섞여 악취로 코를 찔렀다.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하면서부터 물고기가 돌아오고 물이 맑아져 5000여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
| ▲ 중랑천 상류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호사비오리 수컷' 호사비오리는 매우 희귀한 잠수성 오리로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IUCN에도 이름이 올라있는 국제적 희귀종이다. (사진 제공=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중랑천철새보호구역을 산책하다보면 추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연신 물속을 오가며 먹이활동에 여념이 없는 오리들을 비롯해 여유롭게 무리지어 아침산책에 나선 물닭 무리, 얕은 물가에는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채는 백로류, 변환깃으로 까만 몸통에 흰머리를 보이는 민물가마우지들, 모래톱에 무리지어 앉아 몸단장에 여념이 없는 재갈매기와 한국갈매기 무리들은 쌍안경 없이도 맨눈으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개체 수 문제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원앙무리도 여기저기서 쉽게 관찰이 되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가창오리와 중랑천 상류에서는 호사비오리 암수도 만날 수 있다.
 |
| ▲ 청둥오리 |
겨울철 한반도를 찾는 철새는 120여 종에 140만 마리에서 많을 때는 160만 마리 정도 된다. 이들은 매년 3~4월까지 머물며 한반도의 겨울 풍경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서울시가 매년 11월에서 2월 사이 실시하는 겨울철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중랑천철새보호구역에는 예년에 비해 조금 줄기는 했지만 38종 3,367마리가 관찰되었다.
 |
| ▲ 물닭과 청둥오리 |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 출현한 조류는 물닭(27.9%), 원앙(11.7%), 청둥오리(9.0%), 참새(6.5%), 민물가마우지(3.2%) 순으로 많았다. 법정보호종은 원앙,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참매, 새매, 호사비오리 등이 관찰되었고 뒷부리장다리물떼새가 서울에서 처음 기록되기도 했다.
 |
| ▲ 민물가마우지 |
지난달 16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중랑천 용비교 쉼터 인근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20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왜곡된 발표라는 것이다.
중랑천하구철새보호구역은 10여 년 전에 비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새들의 이동이 줄고 물이 맑아지면서 오히려 야생조류에게는 먹이가 부족해 개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원인은 사람들에게 있다. 대규모 준설을 비롯해 해마다 이어지는 호안공사 등 하천 정비공사와 시민을 위한 편의, 운동시설 설치와 하천주변의 갈대 및 관목 제거로 인해 조류 서식지를 교란하면서 중랑천을 비롯해 도심 하천을 찾는 야생조류의 개체 수가 줄어든 것이다.
 |
| ▲ 중랑천 상류지역에서 촬영한 호사비오리 암컷 (사진 제공=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성동구 중랑천변을 찾은 원랑의 수가 올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년 전 1,000개체가 넘었던 것이 60% 넘게 줄어 400마리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이정숙(56) 대표는 개체 수 감소 원인에 대해 "해마다 이뤄지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수변에 조성된 육교, 계단, 산책로, 돌다리 등이 이곳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텃새 이동새들에게 위협을 줬다. 더욱 지난해에서는 물가에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부에 데크공사를 추가했다"면서 "수변녹지 제초작업, 벌목, 과도한 가지치기 등도 새들의 먹이터와 산란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고방오리(앞쪽)와 물닭이 얕은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중랑천철새보호구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중랑천에서 매일 산책을 하면서 새들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작년보다 개체수가 감소한 것 같다”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롭게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 ▲ 물닭 |
최근 원앙 200여 마리가 중랑천을 찾았다는 기사에 대해 그린새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는 “원앙이 예쁘고 화려해 야생에서 알을 주어다 인공부화시켜 한때 관상조류로 많이 키웠다. 그런 원앙들이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전국 어느 동물원, 공원 하천에서도 원앙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앙은 천연기념물이긴 하지만 법종 보호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 대표는 “중랑천의 원앙은 해마다 개체수의 변화는 있지만 최소 200마리에서 많게는 500마리까지 관찰이 된다. 하천 공사로 인해 쉴 곳이 부족한 원앙 무리가 일시적으로 한 곳에 모여 사람들 눈에 쉽게 띈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
| ▲ 중랑천하구철새보호구역은 10여년 전에 비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새들의 이동이 줄고 물이 맑아지면서 오히려 야생조류에게는 먹이가 부족해 개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염형철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까지 철새들이 주요하게 서식했던 곳은 응봉교 인근의 여울과 수변부로, 천적들을 경계하고, 사람들의 간섭을 피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며 “지난해 해당 구간에서 대규모 준설작업이 벌어지면서 원앙들이 사람들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열악해진 서식환경을 피해 이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 대표는 “올해 원앙 200마리가 새롭게 왔다는 보도는 부정확한 내용이며 원앙의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매년 11월에서 2월 사이 실시하는 겨울철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모니터링 최근 5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들의 변동추이는 크게 없어 보인다. 2019년 44종 3,269마리에서 2023년에는 38종 3,367마리가 관찰되었다.
원앙 역시 2019년 429마리에서 2023년 366마리가 관찰되었고 3월 초에 발표 할 원앙 개체수 역시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은 “서울시 조류센서스 결과 이동성이 큰 조류의 특성상 기후요인과 조사지역 현황, 철새의 이동경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조류 개체수 등락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증감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